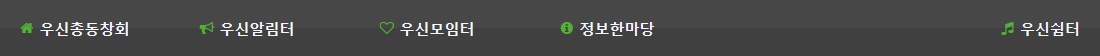선생님에 대한 추억 - 최광준 선배
페이지 정보
작성자본문
예전 선생님에 대하여 혹시 자료가 있을까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발견한 글입니다.
글쓴 최광준 선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13-4회 정도로 추측됩니다.
무단 전제이고 내용 중에는 제가 알기로 "그저 풍문" 내지 "선생님에 대한 온갖 추측"성 내용도 있는 것 같 지만, 그냥 선생님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고자 올려봅니다.
============================================================
작성 : 최광민 1/2/2003
주제 : 묵타난다
이영남 선생님이란 분이 계셨다. 고등학교 3학년때 담임이셨는데, 이 분은 내 모교 선생님들 중 가장 특이한 분 중 하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선생님은 원래 서울대 공대 학생회 간부로 박정희 정권초기 한일국교 정상화 문제로 촉발된 6.3.사건의 주모자 중 하나였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잘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을 가끔씩 툭툭 던지고는 했는데, 학생대표로 박정희를 만난 이야기 (박정희에 대해선 의외로 그다지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라든지, 가끔씩 "우리 친구 덕룡이"란 말을 쓰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정치인 "김덕룡"을 말한다는 것은 대학을 들어가서야 알았다. 시위를 하다가 수배당해 김동길 교수의 누나인 김옥길 이화여대 교수집에 숨어살던 시절 이야기도 파편적으로 흘리곤 했다. 또한 말 끝마다 "승부사적 기질"을 운운하셨는데, 이 또한 김영삼이 애용했던 표현이란 것도 나중에 알았다. 선생님은 베트남에 한국 정규군이 투입되기 직전에 베트남에 파병되었었는데, 무기는 M1이었고, 소대원들은 정치범 혹은 전과 5범 이상의 강력범이었다고 한다. (이런 부대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자료부족으로 잘 알 수 없다.) 소대원 전원이 3명을 제외하고 몰살당하고 본인은 불행 중 다행으로 말라리아에 걸려 후방으로 이송되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여름에도 날씨가 흐리다 싶으면 내복을 입고 다니셨다. 이 분은 동아일보 정치부 해직기자 출신이다. 정확한 직책은 알 수 없지만 정치부 <차장>까지 했다는 말을 얼핏 들은 것 같다. 아마도 아버지가 교육계에 있었던 인연으로 사립 고등학교로 와서 교사가 되기로 한 것 같았다.
내가 기억하는 이 선생님에 대한 기억은 크게 선명한 명암으로 대비된다.
선생님은 매우 정열적이었다. 반 배정이 새로되면 이 선생님은 큰 챠트를 하나 만들어서 기도원에 들고갔다. 사진과 개인 인적사항이 적힌 이 챠트를 몽땅 외워서 내려오는 것으로 유명했다. 내가 그 선생님에게서 받은 첫인상도 역시 그것이었다. 선생님 별명은 <짱꼴라>였는데, 매일 아침조회와 저녁조회를 1시간 씩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조회시간에는 처음 듣는 사람들의 잠언같은 것을 읽어 내려나가기도 했다. 주로 톨스토이의 <인생독본>류의 잠언집이 대부분이었다. 공동번역 <성서>도 그때 처음으로 알게되었다. 본인은 기독교도였지만 불경이나 유학경서도 즐겨 인용했다. 오래전에 이혼을 하셔서 집에 좀체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는 늘 맨 뒷자리에 앉아서 11시까지 공부를 하곤 했다. 독일어나 러시아어 등 외국어를 주로 공부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우리반 학생들은 선생님의 진지함과 열성적인 모습을 누구나 좋아했다. (바로 이 점으로 인해 선생님은 다른 반 선생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선생님의 어두운 면은 그의 긍정적인 인상과 분리될 수 없다. 그것은 좌절한 지식인의 모습이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나는 선생님을 존경하면서도 싫어했다. 이를테면 좌절의 충격이 너무 커서 현실과 잘 동화되지 못하는 것 처럼 보였다. 선생님의 그 공부에 대한 집착이 우러러 보였던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도대체 왜 러시아어를 공부하는 것인지 나로서는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것은 아마도 좌절을 보상받기 위한 심리적 방어기제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른 선생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다. 선생님은 자신이 있을 곳이 학교라고 말했지만, 우리반 학생들 중에 누구도 그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선생님의 눈을 보면 늘 핏발이 서 있었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여느 다른 남학교 선생들처럼 우리를 아무 이유없이 구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는 선생님으로 부터 맞을때 그 이유에 충분히 동의했고, 아무런 심리적 저항감 없이 맞았다. 다만 나는 지금도 선생님의 그 핏발 선 눈을 잊을 수 없다. 선생님은 원래 대단히 과격하고 다혈질이었던 것으로 느껴졌다. 그런 사람이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으니 그 내부의 모순이 얼마나 심했을 것인가.
선생님은 조회때 종종 묵타난다란 사람의 잠언을 읽곤 했다. 지금도 기억하는 그 말은 “너는 내면으로 침잠하라”라는 말이다. 묵타난다는 나중에 알았지만 스와미 묵타난다라는 현대 인도의 구루다. 나는 오쇼 라즈니쉬같은 소위 구루들을 과히 좋아하지는 않지만, 묵타난다의 이 말은 꽤 좋아했던 것 같다. 오랜 세월을 지나온 내면을 향한 나의 집착은 그때부터 <침잠>이라는 이름을 내걸게 되었다. 아마 선생님도 현실과 꿈의 괴리를 <침잠>으로 해결하려고 했겠지.
새해를 맞아 나는 더이상 침잠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결심하고 나니 그 선생님이 떠올랐다. 선생님은 내게 <침잠>이란 단어를 알려준 첫번재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 <침잠>이 어떤 어두운 면을 가지는 것인지도 알려준 반면교사이기도 했다. 침잠은 컴플렉스를 걸러내기도 하지만 , 동시에 방어기제를 은폐하는 교묘한 장치가 되기도 한다. 내면의 평화는 단순히 <침잠>하는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컴플렉스와 <화해>하는데서 온다는 것을 지금부터 10년 전에 나는 발견했다.
나는 아직도 선생님에 대해 많은 것을 기억한다. (아무도 급우 중에서 선생님의 과거에 대해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일게다.) 선생님은 3학년이 된후 처음있던 면담에서 나보고 남자라면 모름지기 정치를 해야한다는 말을 힘주어 했다. (“우리 덕룡이” 발언은 이때 처음 나왔다. 사실 김덕롱은 가끔 선생님을 만나러 우리 학교에 나타나기도 했다.) 우리반이 이과반이었다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 말이었다. 나는 1989년 12월, 학력고사를 마치고 신입생 신체검사를 갔다가 그동안 폐기흉을 앓아온 것이 밝혀져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무렵은 5공 청문회가 한참이었다. (나를 담담한 의사는 이름이 원종성이었는데, 방송인 원종배와 친척지간 인듯 목소리와 얼굴이 똑같았다.) 어느날 선생님이 병문안을 오셨는데, 내 손을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학력고사에 떨어지길 바랬다면서 재수를 해서 문과로 가라고 하셨다. (“우리 덕룡이도 소개시켜주고...” 란 말도 했었다.) 선생님의 그런 말과는 별도로, 나는 사실 대학와서도 오랫동안 문과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매우 고민했었는데, 이런 것이 원인이 되었는지 나는 선생님을 뵙길 매우 꺼렸고,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생님을 딱 한번 찾아갔을 뿐이다.
그 선생님이 얼마전 미국에서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선생님을 만나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느데, 결국 이승에서는 하지 못한 말이 되고 말았다. 나중에 뵙게 되면 꼭 선생님과 함께 묵타난다와 선생님의 <침잠>과 컴플렉스에 대해 말해보고 싶다. 물론 나의 침잠과 컴플렉스도 아울러서.
글쓴 최광준 선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13-4회 정도로 추측됩니다.
무단 전제이고 내용 중에는 제가 알기로 "그저 풍문" 내지 "선생님에 대한 온갖 추측"성 내용도 있는 것 같 지만, 그냥 선생님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고자 올려봅니다.
============================================================
작성 : 최광민 1/2/2003
주제 : 묵타난다
이영남 선생님이란 분이 계셨다. 고등학교 3학년때 담임이셨는데, 이 분은 내 모교 선생님들 중 가장 특이한 분 중 하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선생님은 원래 서울대 공대 학생회 간부로 박정희 정권초기 한일국교 정상화 문제로 촉발된 6.3.사건의 주모자 중 하나였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잘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을 가끔씩 툭툭 던지고는 했는데, 학생대표로 박정희를 만난 이야기 (박정희에 대해선 의외로 그다지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라든지, 가끔씩 "우리 친구 덕룡이"란 말을 쓰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정치인 "김덕룡"을 말한다는 것은 대학을 들어가서야 알았다. 시위를 하다가 수배당해 김동길 교수의 누나인 김옥길 이화여대 교수집에 숨어살던 시절 이야기도 파편적으로 흘리곤 했다. 또한 말 끝마다 "승부사적 기질"을 운운하셨는데, 이 또한 김영삼이 애용했던 표현이란 것도 나중에 알았다. 선생님은 베트남에 한국 정규군이 투입되기 직전에 베트남에 파병되었었는데, 무기는 M1이었고, 소대원들은 정치범 혹은 전과 5범 이상의 강력범이었다고 한다. (이런 부대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자료부족으로 잘 알 수 없다.) 소대원 전원이 3명을 제외하고 몰살당하고 본인은 불행 중 다행으로 말라리아에 걸려 후방으로 이송되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여름에도 날씨가 흐리다 싶으면 내복을 입고 다니셨다. 이 분은 동아일보 정치부 해직기자 출신이다. 정확한 직책은 알 수 없지만 정치부 <차장>까지 했다는 말을 얼핏 들은 것 같다. 아마도 아버지가 교육계에 있었던 인연으로 사립 고등학교로 와서 교사가 되기로 한 것 같았다.
내가 기억하는 이 선생님에 대한 기억은 크게 선명한 명암으로 대비된다.
선생님은 매우 정열적이었다. 반 배정이 새로되면 이 선생님은 큰 챠트를 하나 만들어서 기도원에 들고갔다. 사진과 개인 인적사항이 적힌 이 챠트를 몽땅 외워서 내려오는 것으로 유명했다. 내가 그 선생님에게서 받은 첫인상도 역시 그것이었다. 선생님 별명은 <짱꼴라>였는데, 매일 아침조회와 저녁조회를 1시간 씩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조회시간에는 처음 듣는 사람들의 잠언같은 것을 읽어 내려나가기도 했다. 주로 톨스토이의 <인생독본>류의 잠언집이 대부분이었다. 공동번역 <성서>도 그때 처음으로 알게되었다. 본인은 기독교도였지만 불경이나 유학경서도 즐겨 인용했다. 오래전에 이혼을 하셔서 집에 좀체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는 늘 맨 뒷자리에 앉아서 11시까지 공부를 하곤 했다. 독일어나 러시아어 등 외국어를 주로 공부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우리반 학생들은 선생님의 진지함과 열성적인 모습을 누구나 좋아했다. (바로 이 점으로 인해 선생님은 다른 반 선생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선생님의 어두운 면은 그의 긍정적인 인상과 분리될 수 없다. 그것은 좌절한 지식인의 모습이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나는 선생님을 존경하면서도 싫어했다. 이를테면 좌절의 충격이 너무 커서 현실과 잘 동화되지 못하는 것 처럼 보였다. 선생님의 그 공부에 대한 집착이 우러러 보였던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도대체 왜 러시아어를 공부하는 것인지 나로서는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것은 아마도 좌절을 보상받기 위한 심리적 방어기제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른 선생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다. 선생님은 자신이 있을 곳이 학교라고 말했지만, 우리반 학생들 중에 누구도 그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선생님의 눈을 보면 늘 핏발이 서 있었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여느 다른 남학교 선생들처럼 우리를 아무 이유없이 구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는 선생님으로 부터 맞을때 그 이유에 충분히 동의했고, 아무런 심리적 저항감 없이 맞았다. 다만 나는 지금도 선생님의 그 핏발 선 눈을 잊을 수 없다. 선생님은 원래 대단히 과격하고 다혈질이었던 것으로 느껴졌다. 그런 사람이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으니 그 내부의 모순이 얼마나 심했을 것인가.
선생님은 조회때 종종 묵타난다란 사람의 잠언을 읽곤 했다. 지금도 기억하는 그 말은 “너는 내면으로 침잠하라”라는 말이다. 묵타난다는 나중에 알았지만 스와미 묵타난다라는 현대 인도의 구루다. 나는 오쇼 라즈니쉬같은 소위 구루들을 과히 좋아하지는 않지만, 묵타난다의 이 말은 꽤 좋아했던 것 같다. 오랜 세월을 지나온 내면을 향한 나의 집착은 그때부터 <침잠>이라는 이름을 내걸게 되었다. 아마 선생님도 현실과 꿈의 괴리를 <침잠>으로 해결하려고 했겠지.
새해를 맞아 나는 더이상 침잠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결심하고 나니 그 선생님이 떠올랐다. 선생님은 내게 <침잠>이란 단어를 알려준 첫번재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 <침잠>이 어떤 어두운 면을 가지는 것인지도 알려준 반면교사이기도 했다. 침잠은 컴플렉스를 걸러내기도 하지만 , 동시에 방어기제를 은폐하는 교묘한 장치가 되기도 한다. 내면의 평화는 단순히 <침잠>하는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컴플렉스와 <화해>하는데서 온다는 것을 지금부터 10년 전에 나는 발견했다.
나는 아직도 선생님에 대해 많은 것을 기억한다. (아무도 급우 중에서 선생님의 과거에 대해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일게다.) 선생님은 3학년이 된후 처음있던 면담에서 나보고 남자라면 모름지기 정치를 해야한다는 말을 힘주어 했다. (“우리 덕룡이” 발언은 이때 처음 나왔다. 사실 김덕롱은 가끔 선생님을 만나러 우리 학교에 나타나기도 했다.) 우리반이 이과반이었다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 말이었다. 나는 1989년 12월, 학력고사를 마치고 신입생 신체검사를 갔다가 그동안 폐기흉을 앓아온 것이 밝혀져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무렵은 5공 청문회가 한참이었다. (나를 담담한 의사는 이름이 원종성이었는데, 방송인 원종배와 친척지간 인듯 목소리와 얼굴이 똑같았다.) 어느날 선생님이 병문안을 오셨는데, 내 손을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학력고사에 떨어지길 바랬다면서 재수를 해서 문과로 가라고 하셨다. (“우리 덕룡이도 소개시켜주고...” 란 말도 했었다.) 선생님의 그런 말과는 별도로, 나는 사실 대학와서도 오랫동안 문과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매우 고민했었는데, 이런 것이 원인이 되었는지 나는 선생님을 뵙길 매우 꺼렸고,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생님을 딱 한번 찾아갔을 뿐이다.
그 선생님이 얼마전 미국에서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선생님을 만나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느데, 결국 이승에서는 하지 못한 말이 되고 말았다. 나중에 뵙게 되면 꼭 선생님과 함께 묵타난다와 선생님의 <침잠>과 컴플렉스에 대해 말해보고 싶다. 물론 나의 침잠과 컴플렉스도 아울러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