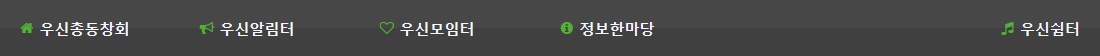장정일,『술통』(4회 장승욱 저)을 읽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본문
책제목 : 술통 지은이 : 장승욱(우신4회) 출판사 : 박영률출판사 시인 장정일님의 술통에 대한 독후감입니다. 왜 '술통'은 자꾸 뒤로 굴러 가는가? 장정일, 『술통』을 읽다
어쩌자고 형은 허구한 날 취생몽생(醉生夢生)했을까? 취생에 흠뻑 마음 빼앗긴 것은 형의 타고난 운명으로, 집안 내력에 부쳐야 한다. 부친께서 즐겼기 때문인데, 원래 술을 못 먹는 체질은 하늘이 정했다는 뜻으로 천계(天戒)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몽생은? 시인이었던 까닭이다. 서로 궁합이 잘 맞는 취생과 몽생은 원래 시인이라는 숙주(宿主)에 빌붙어 사는 기생물 세트다. 시인이 아니더라도 취생할 수 있으나, 몽생할 수는 없다. 그 좋은 직장을 다 때려치우고 '여기는 아님'이라고 어깃장 놓는 게 바로 몽생. 잘 모르겠으면, 이태백을 생각하면 된다. 그는 술을 마시고 연못 속의 달을 따겠다고 뛰어들었다지 않는가. 『술통』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술을 마셔온 사람의 기록이지만, 이 가운데 많은 기록은 딱히 저자만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술버릇 변천사 가운데 공중전화 부스의 유리 깨기나 찌개 냄비 뒤집기는 한때 나의 버릇이기도 했다. 꼭 예로 든 두 가지 버릇이 아니라 하더라도, 술꾼에게는 누구에겐가 호되게 당하기 전에는 고쳐지지 않는 하나씩의 술버릇이 있다. 고약한 그 버릇은 영영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도 참을 수 있고 상대방도 참을 수 있는, 양해될 수 있는 버릇으로 전이될 뿐이다. 그렇게 나이가 들고 철이 드는 거다. 그러나 형이 쓴 이 책이 흥미로운 것은, 30년 넘게 술을 장복(長服)해 온 사람의 만취이취(滿醉泥醉)가 면면히 이어져서가 아니다. 이 책의 대부분은 형이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집중되어 있고, 오늘 일어난 일을 쓰는 데서조차도 그 시절 주변을 맴돌고 있다. 그래서 독자는 ‘20년 만에’ 그곳을 다시 찾았다거나, ‘몇 십년 만에’ 누구를 만나 회포를 풀었다는 문구를 심심찮게 보게 되는 것이다. 왜 『술통』은 자꾸 뒤로 굴러가는가? 나는 이게 궁금했다. 시간은 불가역하고, 생은 현재진행형인데 말이다. 이 책 94~96쪽에는 형 스스로 한때 절창이라고 생각했다던 안재찬의 「구월의 이틀」이란 시가 전재되어 있는데, 내가 보기엔 바로 이 시가 형이 ‘과거지향’하는 비밀을 가르쳐준다. 사실 이 시는 내가 스물두어 살 때 알게 된 이후로, 매해 구월이 되면 한번씩 읊조리곤 하다가, 어쩌다 선생이 되어서는 문학을 배우려는 학생들에게 삶과 문학에 관한 명료한 은유를 전달하는 작품으로 제시하곤 하는 작품이다. 연쇄적 연상이 음악을 불러오는 이 시에는,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쉴 새 없는 ‘운동’과 거기에 무심한 부동의 ‘정지’가 서로 묘한 대조를 이룬다. ‘감춘다, 내린다, 부푼다, 자란다, 모인다, 되돌아간다, 뻗는다, 부서진다, 만든다, 흔든다, 올라간다, 나른다, 본다, 나른다, 밀려간다, 이룬다, 날아온다, 튼다, 빛난다, 춤춘다’ 등의 동사가 숨 가쁘게 연결되는 이 시는, 국어사전에 등재된 동사들이 총출동한 형국이다. 하지만 그 숨 가쁜 운동 속에서 묘하게 정지된 것이 있다. 시의 화자는 오로지 구월의 ‘이틀’에 못 박혀 있는 것이다. 새로운 도시가 서고 나라가 만들어질 동안, 아니 "빙하시대"가 새로 등장할 만큼 압도적인 시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적 화자는 구월의 ‘이틀’에 고정되어 있다. 당랑거철(螳螂拒轍), 이 배짱 좋은 시적 화자는 대체 무얼 믿고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영겁에 맞설 수 있었던 걸까?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이틀’을 우리는 원체험이나 에피파니의 순간, 또는 시적 화자의 트라우마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사족으로 덧붙이자면, 안재찬 시인이 쓴 「구월의 이틀」을 읽으면 반드시 떠오르게 되는 시인이, 장승욱 형의 고향이라는 강진의 시인 김영랑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이란 시에서 김영랑 시인은 이렇게 썼다.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 모란이 지고 나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 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옵니다” 이 시인에게 ‘이틀’은 모란이 져버린 5월 어느 날 그 ‘하루’다. 단순히 모란이 져버린 것만이 아닌 게 분명한, 그 ‘하루’만이 시적 화자에게 의미가 있을 뿐, 나머지 삼백 예순 날은 안재찬 시인이 말한 것처럼 아무런 의미 없는 “빙하시대”에 불과하다. 문학과 삶은 바로 그 ‘이틀’ 혹은 ‘하루’에 대한 주석이다. 형의 대학시절이 바로 형의 ‘이틀’이고 ‘하루’요, 『술통』의 가장 강력한 누룩은 ‘아름다운 청춘’이다. 물론 이 책에는 대학시절이나 대학친구들과 벌인 무용담만 아니라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난 친구들과 벌인 음주기도 간혹 끼어 있지만, 말 그대로 앞의 것이 무용담이라면 뒤의 것은 음주기에 불과하다. 보들레르가 말하지 않았는가. 어린아이의 웃음은 낙원을 웃는 것이지만, 어른의 웃음은 낙원을 그리워하는 쓴웃음이라고. 그러니 어른들은 멋모르고 마셔댄다고 타박하지만, 오로지 마시는 일 자체가 즐거움이었던 그때의 것이 무구(無垢)하기로는 그지없는 것이었다. 왜 알지 않는가? 사회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술자리가 대부분 생존경쟁의 연장이거나, 비즈니스의 다른 표현이라는 걸. 앞서 누구나 간직하고 있는 ‘이틀’이나 ‘하루’는 당사자의 원체험이자, 에피파니가 일어난 순간, 또는 트라우마가 응결된 것이라고 했다. 『술통』의 강한 취기에 가려져 있지만, 실은 이 책에는 80년 광주를 겪었던 대학생의 절망이 상처로 옹이져 있다. 형은 손사래를 칠지 모르겠지만, “80년 광주를 겪으면서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버렸던 것 같다”, “그 상처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다 …… 광주에서 있었던 아픔, 그리고 광주를 배신한 아픔”같은 구절을 보면 ‘취생몽생’하게 된 원인의 한 자락도 짐작될 듯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진귀한 기록이 한 시절 흔했던 80년대 후일담이거나, 적극적으로 운동에 참여하지 못했던 문학청년의 참회록일 수는 없다. 그러기에는 이 책의 또 다른 면목이 너무 강렬하다. 고등학교 시절 다섯 달 동안 끈질기게 쫒아 다녔던 첫사랑의 여고생이 말을 걸어오자 “눈을 질끈 감고 뒤돌아 달”렸던 것하며, 군에서 제대하고 나서 매일 밤 디스코테크를 전전하며 “미친 춤으로 세상과 나 사이에 뚜렷이 금을 그었던 것”, 또 단골 술집의 주인 여자가 두어 번 말을 걸어오자 “거북스러움"을 느끼고 점차 발을 끊게 된 일 등은, 아무래도 세상과 거리 두기를 전문으로 하는 회의주의자의 것이지 싶다. 이 책의 저자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입에 맞는 미주(美酒)를 찾고 주량을 늘려 갔다니 과연 『술통』은, 치욕과 탕진의 기록이 아니라 술을 앞에 놓고 세상을 배우려고 했던 유별난 학동의 인생 수업록이라 할 것이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